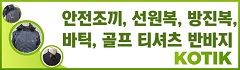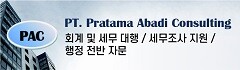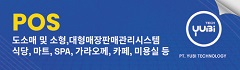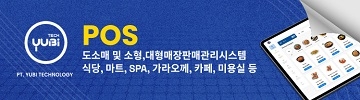어느 작가의 집짓기 9 - 그 땅의 사람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학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0-30 06:03 조회3,097회 댓글0건본문
찌자얀띠! 제 새로운 삶터가 될 신축지의 동네 이름입니다. 겉보기엔 작은 읍내쯤의 분위기이지만
왜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많은지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사업자가 파견한 몇 사람을 재외하곤 대부분 걸어서 현장엘 오는 찌자얀띠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서 나고 자랐으며 여전히 거기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평소엔 빌린 밭뙈기에 일정량의 작물을 심고 가꿔 거두며, 시간이 나면 바나나, 망기스, 씽콩 등
그 땅의 농산물을 길거리에 가지고 나가 팔기도 한답니다. 염소를 필두로 가축 몇 마리 거두다가
주변에 일판이 생기면 가리지 않고 일당벌이를 하는 가난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제 아내는 감독관입니다>

심각한 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들, 그래서 그들의 일하는 모습은 더러 일인지 놀이인지
구분이 잘 안가기도 합니다. 부리는 입장에선 속이 터질 노릇입니다. 정년퇴임을 하고 용돈을 벌기 위해
일을 찾아 나왔나 생각이 들었던 나이 지긋한 인부도 그렇고, 아르바이트 학생인줄 알았던
열여섯 청소년의 일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얼굴과 이름을 익히고 보니 누구와 누군 조손 관계,
누구와 누군 부자간이었습니다. 4명의 형제가 일을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아주 다정하게 함께 현장엘 오가고
아주 은근하게 조를 맞춰 일을 합니다. 아직 20대 임에도 기술직(Tukang) )인 사람이 있고 30년 경력자라는데
잡역(Kendek)을 고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품삯 차이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는 것 같은 그들은,
나이 차이나 부자간도 상관없이 맞담배를 물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일을 합니다. 2~30년 공사판 경력을
쉽게 말하면서도, 십장자리 같은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치는 그들에게 진급이나
더 나은 수입이란 개념조차 없는 듯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것이나 가난은 조금도 이상스러울 것이 없다는 정서에,
먼 곳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도 적고, 부와 명예 같은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순수하거나 욕심이 없다고 결론할 수 없습니다. 우선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이라면
덜 가진 사람과 무조건 나눠야 한다는 무슬림 특유의 사고를 이해해야 합니다. 조금만 방치해두면
크고 작은 분실물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큰 소리를 내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타일러야
한다는 점이고, 얼마 아니 가서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것을 예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가 와서 일을 멈추는 것은 당연하고, 반드시 그날 마쳐야 할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는 일순간 안면을 바꿉니다.
담장을 치는데 거치적대는 나무 가지 좀 자르겠다고 했더니 대뜸 돈부터 요구하는 이웃은 상식이었습니다.
외부 차량이 건축자재를 싣고 들어오면 동네 어귀에서부터 따라 붙어 하차를 핑계로 일정액을 요구하는
또 다른 부류들에게 마저도 그저 그들의 정서려니 생각해야 합니다. 핑계대기 박사들과, 감탄할 수준의
무책임논자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돌아서는 사이 거짓말이 탄로 나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란 찾아볼 수 없는
사람과도 눈을 마주치면 웃어야 합니다. 그들은 늘 저보다 더 활짝 웃기 때문입니다.
문명이나 도시와 참으로 가까우면서도 참으로 멀리 있는 마을. 가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너무도
분명하게 지닌 사람들, 일을 시작한지 7개월여 동안 힘든 건축현장에서 서로 간에 언성을 높이거나 다툼을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들, 그곳에서 젊은이가 되고 노인의 길에 들었음에도 자동차로 한 시간여 거리의
자카르타를 구경 한 번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은 마을.

<늘 다정한 부자>

<함께 일하는 4형제. 그들은 모두가 솜씨가 좋고 부지런한 보기 드문 자원들입니다>

<체구는 작기만 부지런한 형제들>
오늘도 그 마을 사람들 다수가 제 신축지에서 땅을 파고 흙을 옮기며, 담을 치고 기둥을 세웁니다.
뙤약볕에서 땀을 흘리고 뙤약볕으로 땀을 말립니다.
더디지만 그들에 의해서 새로운 삶터 하나가 모양이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장차 더불어 살 제 이웃입니다.
2012년 10월 29일
인재 손인식의 필묵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