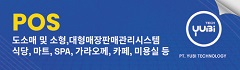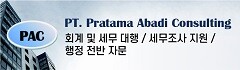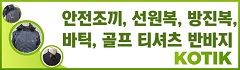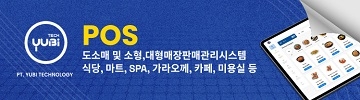데사드림 閑談 1. 여백 찾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데사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7 11:31 조회1,796회 댓글0건본문
DESA DREAM 閑談 1
여백 찾기
길이 밀려온다. 2층 테라스에 앉으면 마을길이 와락 다가든다. 바깥나들이를 할 때마다 무시로 거치는 길, 마을을 뒤덮은 숲에 가려 보이는 데라고는 아주 잠깐이고 그나마도 반쪽만 보이는 길, 오가는 차량의 불빛이나 악을 쓰며 내달리는 오토바이들로 인해 비로소 존재가 좀 더 분명해지는 길, 처음엔 그냥 보이던 그 길이 이젠 보이지 않은 구불구불한 궤적까지 훑으라고 한다.


길의 존재 방식
길은 시다. 파상적으로 대지를 훑는 아침햇살이 새벽안개를 사정없이 쓸어 가도 시샘하지 않는다. 초록의 무성함과 하늘을 다투지 않는다. 무차별로 길 위에 깨지는 한낮의 따글또글한 햇볕을 묵묵히 수용한다. 마을과 숲의 경계를 가뭇없이 허무는 억수비가 쏟아 져도 길은 미동도 일탈도 없다. 석양의 노을이 만상을 붓질해도 다만 여실할 뿐 외로움을 드러내지 않는다. 무위함이 곧 스스로 그러한 것임을 명료하게 설법한다. 이국인으로서 첫 번째 이 마을 주민이 된 내게 그야말로 돌직구를 날린다. 내 능력의 수판질로는 따져보기 쉽잖은 길의 도(道)다.
길은 길보다 그 존재감이 반 뼘쯤 앞서는 안산으로부터 시작한다. 안산은 내가 사는 집과는 알맞게 거리를 두고 아늑한 높이로 자리 잡고 있다. 안산은 그 미려한 등을 툭 잘라 길로 내준 미덕을 지녔다. 길은 무시로 오가는 차량들을 내세워 거기 안산 산록에 마을의 관문이 있음을 알린다. 그리고 이내 마을을 뒤덮은 숲으로 종적을 감춘다. 숲길에서 잠수를 거듭하던 길은 내가 사는 집 가까이에서 불쑥 그 잠깐을 드러내 짧은 호흡을 한다.
길은 그 흐름이 참 아름답다. 그것은 길이 놓인 위치와 숲의 연출이기도 한데, 다가드는 앞모습은 다소곳이 보여주는 반면 흘러 나가는 뒷모습은 얌전히 숲으로 가린다. 음전함의 진수다. “원 별 것을 다…”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길이 내게 여유가 되어주는 이유 중 하나다. 그렇잖은가?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포근하고 활기차게 자신에게 다가든다면 누구라서 싫다고 하겠는가. 이것은 그 동안 가까웠던 이웃들과 외떨어져 사는 외로움을 물리쳐주는 역할도 한다. 혼자서 상념에 젖을 때나 차를 마시고, 한 잔 술을 벗할 때도 다가드는 길의 방향과 흐름은 분명 한 알의 안정제다. 하늘 보다 더 큰 어둠이 내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릴 때도, 달빛과 별빛 까맣게 져버린 칠흑 밤에도, 지나는 차량의 스치는 불빛에 드러나는 길은 그 사실로 곧 위안이다.


한 가지를 오래보면
길은 내가 꼬박 10년을 살았던 자카르타를 벗어나 이 산골마을로 들어오는 길을 지켰었다. 산마을 생활로 들어서는 신행을 호위했고, 활동무대를 고국으로 옮길까 고민하던 기로의 선택을 함께했다.
한 가지를 자주 보고 오래 보면 좋은 것이 있다. 그것에 대해 아주 간절해지는 것이다. 무엇에 대해 간절해진다는 것은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내면과의 소통이라고 나는 믿는다. 작가에게는 그런 순간이 아무리 많아도 넘치지 않을 꼭 필요한 요소일 것이다.
나는 무엇에 대해 간절해지는 순간이 좋다. 시간과 정렬을 쏟은 다음 도달하게 되는 진한 간절함이라면 거기가 진흙 구덩이라도 풍덩 빠지고 싶다. 먼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어느 곳에서는 넋 놓고 한 이틀쯤, 어느 곳에서는 커피 한 잔 놓고 한나절쯤 죽쳐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도 그런 연유다. 그러므로 겨우 테라스에 앉아 내려다보는 마을길로 인한 간절함이지만 그 여유가 싫지 않다. 결코 감정 낭비가 아니라고 여긴다. 하물며 이국의 산마을에 서원(書院)을 세우겠다는 꿈을 실천에 옮기면서 겪은 수고와 난감함, 지불한 학비가 얼만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 정도는 조족지혈(鳥足之血)이었다.
내적 과녁을 향해
내가 한국형 문화공간으로서 서원을 꾸며보기로 작정하고 경주마처럼 돌진한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지난 10년과는 다른 모습이고 싶었다. 모름지기 작가의 활동은 외적이기보다는 내적 과녁을 향해야 한다는 소신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다. 작은 것을 이루더라도 비루하지는 말자는 다짐도 한 몫을 했다.
살아보니 보고 느낄 많은 대상과 나누는 무언의 대화들이 좋다. 평정심을 얻기에 그만이라는 노동시간이 많아진 것도 나쁘지 않다. 무엇에 대한 간절함이 곧 삶의 여유라는 것도 산골마을에서 살면서 더 확실해졌다. 간절함은 곧 내게 있어 삶이나 작품의 화두인 여백에 다름이 아니다. 이상과 현실 두 접점이 어우러진 나만의 고유한 여백, 바야흐로 이제야 여백 찾기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이다. 나아가 꾸며질 문화공간이 다수에게 하나의 의미가 된다면 얼마나 큰 덤인가.
“길이 안보이거나 길을 헤매는 것은 옛 길을 잊었기 때문”이라 했다. 인도네시아 보고르의 산마을 찌자얀띠의 마을길, 이 길은 오랜 과거로부터 사람들의 발길에 의해 생겨나 오늘로 이어진 길임에 틀림이 없다. 잃어지고 잊힌 적이 없었을 길이다. 밀물처럼 내게 다가드는 길, 그 작은 여백은 오늘도 쉬지 않고 어딘가로 나아간다.
인재 손인식(서예가, 시인)
* 이글은 한인뉴스 8월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