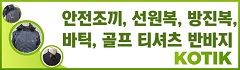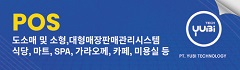한국문인협회 | 루작, 덜 익은 과일들의 오묘한 조합
페이지 정보
작성자 munhyu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3-16 15:52 조회860회 댓글0건본문
루작, 덜 익은 과일들의 오묘한 조합
김주명
열대지방이라면 대게 밀림이 우선 떠오른다. 밀림을 배경으로 한 ‘타잔’을 보면서 자란 필자도 마찬가지이다. 영화 속에서 타잔은 배고프면 열대 과일들로 진수성찬을 차리고 ‘제인’과 과일만큼이나 달콤한 사랑도 만들어간다. 과연 그럴까?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남방작전에 투입된 일본군의 70%가 전투가 아닌 굶주림으로 아사했다고 전한다. 주로 파푸아 뉴기니지역, 솔로몬제도의 과달카날, 버마북부의 밀림지대에서 아사자가 속출했다고 하니, 지형과 기후에 대한 무지가 불러온 당연한 참사로 밖에는 볼 수 없다. 그들은 밀림에서 왜 타잔처럼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을까?

인도네시아에도 밀림지역이 많다. 수마트라와 보루네오 섬의 열대우림지역, 파푸아 뉴기니의 고산지대가 이에 해당한다. 지금도 소수의 원주민들이 그들의 생활방식으로 살고 있을 뿐, 문명의 접근이 쉽지 않다. 필자가 살고 있는 롬복 섬의 린자니산 중턱도 열대우림 지역에 해당한다. 차를 타고 지나가 보면 숲 속에 틈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초록의 숲이 오히려 검게 보인다. 온갖 나무와 풀, 이끼류들이 콩나물시루처럼 빼곡히 차지하고 있으니 아스팔트 길이 그나마 경계선처럼 지나간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찾겠는가?

열대지역의 식생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과일나무의 개화기 가늠하기가 참 어렵다. 파파야나 야자수처럼, 계속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올라가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망고처럼 어느 시기에 일제히 개화하고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도 있다. 또 바나나처럼 딱 한번 개화하는 경우도 있으니, 동네에 드문드문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대체 언제 다 익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솔직히 말해서 익은 과일을 직접 따 먹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반시’로 유명한 필자의 고향, 청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 떫은 감은 주렁주렁한데, 언제 홍시가 될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삭혀내듯 떫은 감을 소금물에 담겨두었다 아삭아삭한 감이 되면 먹었던 기억이 겹쳐진다.
주위에 흔한 열대과일들을 살펴보자. 우선, 파파야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계속 자란다. 그러다 보니, 아래에서부터 파파야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하고, 푸릇푸릇한 파파야를 따서 요리에 쓰면 딱 ‘무’의 쓰임새이고, 맛도 익히지 않으면 수박껍질 맛이 나고 익히면 무랑 거의 같다. 그러니 특별히 반찬거리가 없으면 파파야 하나 따서 양념 넣고 끓이면 훌륭한 반찬이 된다. 또 덜 익은 망고는 풋살구 보다 더 신 맛이 난다. 그래서 동네 임산부가 있으면 덜 익은 망고가 금세 동이 나버리니, 망고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내가 어리석다. 그리고 온갖 덜 익은 과일들을 먹는 방식이 있는데, 바로 ‘루작’이다. 글을 쓰는 필자의 입에도 벌써 침이 고인다.
‘루작’은 대충 이러하다. 고추, 양파, 마늘, 설탕 등 온갖 종류의 양념을 손맷돌로 곱게 갈면 양념장이 완성되고, 다음으로 눈에 띄는 덜 익은 과일인 파파야, 망고, 파인애플과 오이 등을 먹기 좋게 잘라 미리 만들어둔 양념장 소스에 찍어 먹는다.

맛은 어떨까? 양념장에는 매운맛부터 단맛까지 온갖 맛이 순차적으로 느껴지며, 어떤 과일을 고르느냐에 따라 그 맛이 또 첨가된다. 한 번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맛을 느낄 수 있는 기묘한 음식이 탄생되는 순간이다. 밥 먹기 전에는 허기를 잊게 하고 밥 먹은 후에는 후식으로 그만이다. 뭔가 입이 심심하다면 간식으로 ‘딱’이다. 루작을 먹고 난 뒤, 여기 방식으로 된 커피라도 한 잔 곁들이면 한 끼가 절로 완성된다.
대체 어떻게 이 신묘한 음식이 탄생했을지 짧은 역사지식으로만 동원해도 그 연유를 가늠 할수 있겠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동안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동인도 회사가 그 중심에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다 보니, 식민지 지배국의 입장에 맞는 커피와 차, 향신료 등 특수작물들을 주로 재배하였지, 정작 주식은 벼는 대량 재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식민지배가 끝난 시점에도 농업의 환경은 급격히 개선되지 않았고, 60, 70년대를 거치면서 인구까지 증가하니 그야말로 배고픔의 시대였다. 80년대 이후, 관개수로가 건설되고 비료가 보급되면서 획기적으로 쌀의 생산량이 가했다고 하니, 당시 상황을 짐작할 만도 하다. 그 배고팠던 시절의 간절함이 ‘루작’이라는 오묘한 맛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까?
옆 동네에 작은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다. 주로 아이들 주전부리를 파는 곳인데, 역시나 소시지 튀김을 비롯한 여러 종류들이 눈에 띈다. 물론 ‘루작’도 있다. 서녀 명의 아이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는 건 필시 ‘루작’일 것이다. 그 시절은 잊었어도 몸은 그것을 기억하며 잊지 말아야 할 그것을 침 속에 녹여내고 있다.
from 롬복시인
사진촬영하신 롬복의 「나루투어」 박태순 대표님은 ‘롬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유튜브 ‘롬복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