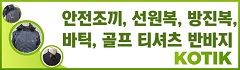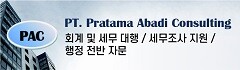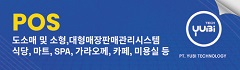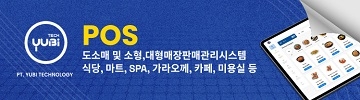작품 값, 당당하게 받아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가가 다 있다. 내가 줘야 할 것도, 내가 받아야 할 때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 작품 값도 마찬가지다. 반드시 치러야 하고 받아야 한다. 저자는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그 당연함을 배웠다. 어머니의 겨울나기 채비 중 큰일 하나가 안방의 도배였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안방 아랫목 위 벽장문에 작은 폭의 대련을 붙이셨다. 다양한 땔감을 사용하던 때였다. 방안엔 스며든 연기 때문에 늘 그을음이 파리똥과 함께 덕지덕지 붙었다. 어머니가 정성스레 붙인 글씨에도 때가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도배하실 때 그 누렇게 변한 글씨 위에 새로 받아온 작품을 덧붙이셨다.
붓글을 쓰는 동네 친척에게 보리 되라도 주고받아온 글이었다. 어머니는 반드시 작은 성의로라도 그 값을 치르고 작품을 받아 오셨다. 사십여 리 떨어진 외가의 외할아버지께 받아오신 적도 있다. 특이한 사실은 어머니는 글을 잘 모르는 분이셨다. 당신의 이름자나 삐뚤삐뚤 쓰시는 정도였다. 한문은 더더구나 이해하셨을 리 없다. 어머니는 막내아들인 저자가 서예가로 살 것을 그때 예견하셨던 것일까?
작품, 고도의 정신노동 결과다. 특히 서예창작의 경우 초안에서부터 작품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파지를 내고 단 한 점 골라낸다. 그 한 점이 전시장에 걸리기까지 쏟은 노력과 정성이 그 얼마인가를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 작품 값은 그 시간 값이다. 아무리 연륜이 깊은 작가라 해도 단 한 번 휘호로 작품을 마무리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게 이벤트 석상이기 때문에 단 한 번 휘호로 그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때도 작가들로서는 내심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2000년, 아직 한국에서 활동할 때다. 그해 11월 인연이 있어 자카르타 중심부 한 호텔에서 전시를 열었다. 그 기간에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UI의 중문과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 요청을 받았다. 대형 강당, 수많은 학생과 교수들이 군집했다. 강의 도중 저자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성어를 휘호했다. 휘호를 마치고 작품을 들어 올려 휘호에 걸린 시간을 물었다. 이구동성 몇 분, 몇 분을 외쳤다. 저자가 30여 년이 걸린 것이라 말하자 학생들이 우~ 소리를 질렀다. 그랬다. 그들의 눈앞에서 있었던 일로서 그야말로 몇 분이었다. 저자가 설명했다. 여러분이 보기에 아주 쉽게 실수 없이 단번에 휘호를 할 수 있기까지 보이지 않은 곳에서 노력한 세월이 30여 년이라고 설명했다. 좌중이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다.
초학자도 전시를 할 경우 작품값을 정해야 한다. 초학자들은 부끄러운 일이라 여길 수 있다. 자기 작품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냥 주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작품값을 정해 놓은 것이 더 좋다. 작품값을 치른 작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인심에 대한 예민한 반응이 아니다. 작품값을 치러야 소장자도 더 자랑스럽게 소장을 할 수 있다. 전시장 작품 옆에 작품가가 붙어있는 것은 절대 흉이 아니다. 작품가 또한 작가가 결정해도 과히 틀린 것이 아니다. 다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절한 값을 정해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욕심을 부리면 볼썽 사납다. 작품의 본질과도 어긋난다 할 수 있다.
작품이란 단순히 벽을 장식하는 것만이 아니다. 소장자의 품격을 높이고 소장처의 분위기를 일신한다. 누구라도 돈이 든 은행통장을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왠지 어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장 작품은 마음 놓고 자랑한다. 고상한 취향이 은근하게 풍긴다. 자랑 횟수가 많을수록 소장 작품의 가치가 자꾸 높아지니, 작가나 소장자 모두 얼마나 기쁜 일인가.
죽은 새우는 공짜
청나라 말과 민국 초기를 산 중국의 작가 제백석(齊白石)이 있다. 그림과 글씨, 전각 등에서 그만의 독창적 세계를 구축한 대가다. 목공 출신인 그가 화가로 전업한 뒤 가난한 집안을 꾸리기 위해 열심히 그림을 그리던 젊은 시절 이야기다. 대가가 된 후에도 작품가에 관한 한 주저함이 없었던 제백석은, 당시 그림을 팔 때 값을 정하는 그 나름의 기준이 있었다. 그림 안의 수량으로 값을 매기는 것이었다. 그림 안의 오리, 새우, 닭, 과일, 물고기 등 그림의 내용이 무엇이든 그 숫자에 따라 값을 정했다.
어떤 사람이 새우 그림을 주문했을 때다. 완성 후 제백석이 그린 새우 숫자로 작품값을 계산하자 주문자는 덤으로 한 마리만 더 그려달라고 했다. 완성된 작품에 붓을 가하라니 작가라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백석은 묵묵히 한 마리를 더 그려 주었다. 주문자가 그 새우를 보니 다른 새우들과 느낌이 달랐다. 이유를 묻자 백석이 대답했다. 공짜이니 죽은 것으로 한 마리 더 준다는 것이었다.
회자하는 백석의 명언은 그를 대변한다. “하루도 놀면서 지내지 마라(不叫一日閑過)” “나를 배우는 자는 살 것이고, 나를 따라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學我者生 似我者死)” 그 제백석의 작품 <송백고립도, 전서사언련>이 2012년 7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경매에서 무려 718억 원에 경매되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일대 사건이었다. 백석은 20세기 중국 작가 중 다작을 하는 작가로 손꼽힌다. 다작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들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그의 뛰어난 정신과 작품성이다.
다작과 과작, 어떤 것이 좋은가
작가에겐 다작이 좋을까, 과작이 좋을까? ‘작가라면 만 점의 작품은 남겨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렇게 많은 작품을 생산한 작가라면 명작을 창작할 능력을 갖추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그중에는 수없이 많은 명작이 있을 것이다. 만 점이면 하루에 한 점을 제작할 경우 대략 30여 년이 걸린다.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 하여튼 작품이 많은 것이 좋다는 말로 이해를 하자. 작품이 귀해야 한다는 말도 틀리지 않는다. 작품이 희귀해야 그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또한 작품의 질이 좋아야 해당하는 말이다.
저자의 생각은 과작보다 다작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다작인데 가치까지 높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이겠다.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마땅히 작품의 질을 높아야 하고 남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다작하되 남발을 막아 스스로 자기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 일이다.
파블로 피카소 이야기다. 그는 역사상 가장 많은 작품을 남겼다고 알려진 작가다. 데생을 포함 무려 10만 점, 그중에는 많은 시간을 투여한 유화가 2만 점이나 된다고 한다. 피카소의 사후 그의 작품 창고가 공개되었을 때 확인을 한바, 10만의 숫자가 틀리지 않아서 충격이었다고 한다. 그저 놀라운 일이다. 1989년 피카소의 ‘피에레타의 결혼’이 미술품 경매에서 한화 약 847억5천만 원에 낙찰되었었다. 유작의 숫자와 작품의 낙찰가는 피카소의 위대함을 대변하고도 남는다.
자랑꺼리, 작가와 인연
저자에게 가끔 전화하는 기업인이 있다. 전화한 이유는 늘 크게 다르지 않다. 사무실에 걸린 저자의 작품을 감상하다가 저자가 떠올라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작품에 눈이 갈 때마다 작품을 곁에 두고 감상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전시회에서 적잖은 대가를 치르고 소장한 작품으로, 애장까지 하니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자다. 그래서 저자 또한 더러 안부 전화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전화를 받는 쪽은 저자이다.
작품을 애장하게 하는 데는 작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면 담긴 뜻을 명확히 전달해주는 것이 좋다. 작품 한 점, 한 점에 이야깃거리를 심어주면 더할 나위없겠다. 창작과정의 에피소드를 들려주는 것도 좋다. 그래서 창작단상이 필요하다. 감상도 창작이라 했다. 감상을 통해 창의성과 감수성을 기름으로서 창작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얻기 때문이다. 작가는 소장자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곧 소장자로 하여금 작품의 가치를 인정하고 애장하게 한다.
소장과정에도 줄거리가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작품과 소장 인이 만나는 것은 개인전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를 통한다면 더할 나위 없다. 가급적 쌍관(雙款), 즉 소장인 이름을 작품 안에 함께 써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별한 경우 소장인과 주는 사람, 작가 등 삼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도 멋진 일이다. 개인전의 경우 쌍관을 할 수 없지만, 평소 의뢰를 받는 작품이라면 될 수 있으면 쌍관을 하는 방법을 찾아 유도하는 것도 좋다.
예전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한 작가의 회고전이 열릴 때다. 작고 한지 50여 년에 이른 작가였다. 저자는 관람하면서 놀라운 발견을 했다. 전시 작품 중 다수가 쌍관이었다. 쌍관 작품의 보존 상태가 더 양호했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자는 쌍관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본인이나 선조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작품을 더 애장했을 테니까 말이다. 각설하고 작품 소장하면서 그 작가와 인연을 자랑하지 않은 사람 없다. 그리고 쌍관을 하기에 제격인 예술품은 누가 뭐라 해도 서예작품이다.


 선생님의글 내용중에
선생님의글 내용중에

 "하루도 놀면서 지내지 마라" 하셨는데...그나마 선생님의 글을 읽었으니 놀고 지낸 것만은 아니라고 위안합니다. ㅎ
"하루도 놀면서 지내지 마라" 하셨는데...그나마 선생님의 글을 읽었으니 놀고 지낸 것만은 아니라고 위안합니다. ㅎ 

 붓을 논지 너무 오래되서
붓을 논지 너무 오래되서


 선생님 어머님께서 그옛날 고상하신 성품을
선생님 어머님께서 그옛날 고상하신 성품을


 제백석의 그림값?
제백석의 그림값?


 남에게 줄 작품을 휘호하는 것은 공모전 출품 작품을 하는 것과는 큰차이가 있습니다.
남에게 줄 작품을 휘호하는 것은 공모전 출품 작품을 하는 것과는 큰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