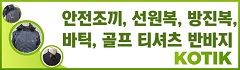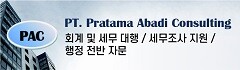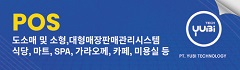한국문인협회 | 제 7회 적도문학상 최우수상(수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munhyu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5-09-02 14:27 조회348회 댓글0건본문
<수필 부문 - 최우수>
긴 단상 - 엄마와 딸
어릴 적, 실과 시간에 바느질을 배웠다. 홈질, 박음질, 감침질…. 바느질을 하려면 바늘귀에 실을 끼워 주욱 당긴 뒤 매듭을 지어 준비해야 하는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귀찮았던 나는 실을 최대한 길게 잡아당겨서 한 번의 준비로 모든 바느질을 끝낼 요량이었다.
“ㅇㅇ이는 머얼리 시집 가겠네.”
무슨 소리인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엄마를 바라보니 엄마가 웃으셨다.
“그렇게 실을 길게 잡으면 친정에서 먼 곳으로 시집 간댄다. ㅇㅇ이 실 잡는 거 보니 결혼해서 바다 건너 해외로 가겠네.”
어린 마음에 엄마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은 싫어서 다음번엔 실을 짧게 잘라 매듭지었지만, 바느질을 하다 보면 중간에 실이 다 끝나서 ‘아, 그냥 길게 할걸….’ 후회하며 새로 바늘귀에 실을 끼우곤 했다.
그날의 기억은 어린 나에게 꽤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 그 후로도 바느질할 때면 늘 엄마의 말이 생각났다. 중학교 가정 시간, 고등학교 가사시간에 꼭 한 번씩 바느질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때마다 스커트를 만들면서, 미니 한복을 만들면서 내 마음에 따라 실을 잘라댔다. 아무런 근거 없는 속설임을 알면서도 사춘기 아이답게 엄마한테 화가 나면 일부러 실을 더 길게 자르고, 엄마와 사이가 좋은 날엔 귀찮음을 감수하고 실을 짧게 자르면서 엄마와 멀리서 살게 될지 가까이 살게 될지 궁금했다.
30년이 지난 뒤, 실의 길이와 친정까지의 거리 비례설은 낭설이 아니었던지 나는 국내와 해외를 수년씩 오가며 살고 있다. 해외살이 할 때면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아쉽기에 한국에 있을 때는 부모님 댁 아주 가까이에 붙어 지내는 내 모습이 어릴 적, 실 길이를 오락가락하며 자르던 모습과 겹쳐져서 웃음이 나온다.
이제는 내 아이가 그때의 나보다 훌쩍 커 버렸다. 아이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며 학교를 다닌 탓에 나와 같은 바느질 숙제를 한 적이 없어서 실을 얼마나 길게 자르고 싶은지 알 수 없다. 지금 한창 수험생 시기를 보내며 예전의 나처럼 엄마가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을 것이다. 낯선 땅에서 새로 적응해야 할 때마다, 많이 힘들고 외로웠을 아이. 아무리 도와주고 지지해 준다 하더라도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할 부분들은 오롯이 혼자만의 몫이기에 우리의 이 떠돌이 생활이 지긋지긋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의 적응, 공부 스트레스, 진학에 대한 고민에 더불어 친구 관계까지 아이를 가장 힘들게 했을 때, 결국 아이는 문을 꼭 닫고 자기 방에 틀어박혔다. 기다릴수록 입도 닫고, 귀마저도 닫아버리는 아이를 보고 한밤중에 어두컴컴한 방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 옆에 같이 누웠다. 한 달, 두 달, 석 달…. 마치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었던 시절처럼 깜깜한 방 안에서 큰 아이를 품고 재웠다. 조금씩 나아지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 사이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탯줄이 이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음식물을 꼭꼭 씹어 삼켜 영양분을 보내듯 내 생각을 잘 갈무리해서 전해주고, 탯줄로 노폐물을 되돌려 보내듯이 아이가 뱉어내는 하소연들도 내가 다시 거두어들였다. 그렇게 수개월,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아이는 다시 밝아져서 방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우리 둘 사이의 보이지 않는 탯줄이 느껴진다. 내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하게 버텨내고, 내가 무너지면 아이도 다시 괴로워한다.
세상에 엄마가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 중에서도 딸과 엄마에게는 다른 관계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어도 가장 감정이 뒤섞여 들어가는 관계랄까. 자기 자신은 아니지만 타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 같은 엄마와 나 사이의 실, 나와 아이 사이의 탯줄. 그리고 그 후로도 이어질 긴 연결고리들을 떠올리면 나의 일부가 계속 살아 숨 쉬는 듯한 느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