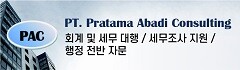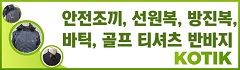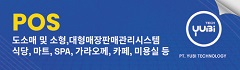문화연구원 | 제 8회 ‘인도네시아 이야기’ 인터넷 문학상 '대상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상 수상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인니문화연구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0-23 08:45 조회1,499회 댓글0건본문
대상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상 수상작
벙아완 솔로
Bengawan Solo
김영수 Kim Young Soo
(PT. Semarang Garment 전무)
햇빛 반, 빗줄기 반
내 기억은 더운 길 따라 달려와
물가에 섰다
머리 속 강폭 보다 허무하게 더 좁은
조붓한 물줄기는
빈사의 황토 물을 안고 있을 뿐
바람 따라 오고 간, 돛단배들은
어제로 귀항한지 오래고,
시간의 퇴적 속에 관념이 된 사실들만이
흔적으로 흐르고 있었다
이제,
노래로만 남은
강을 잊은 강, 벙아완 솔로는
도시의 매연 따라, 사람들 망각 속에서
조용한 익사를 하고 있었다
[시작 노트]
오래 전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음악 교과서에 실린 악보 중에 ‘붕가왕 솔로’라는 것이 있었다. 그 노래는 교과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었는데 외국 민요라고 소개 되어 있었다. 그 날 음악 시간에 배웠던 우리 말로 된 ‘붕가왕 솔로’ 노래 가사는 이제는 기억 나지 않지만, 제목만큼은 내 머리 속에 뚜렷이 남게 되었다. 왜냐 하면, 어느 왕국의 붕가라는 왕(王)이 솔로, 독창(獨唱)하는 노래라고 제목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학부에서 인도네시아어를 전공하면서 다양한 인도네시아 문화를 접하게 되었다. 그 중에는 민요도 포함 되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벙아완 솔로’ (Bengawan Solo)도 배우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어로 된 아름다운 노래 가사를 익히면서, ‘붕가왕’이 왕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어로 ‘강’을 의미한다는 것을 비로서 알게 되었다. 즉 솔로 강이라는 의미였다.
20세기 초에 작곡된 ‘벙아완 솔로’는 우리나라의 ‘아리랑’처럼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민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 동안 해외에 널리 소개되어 이제는 많은 외국인들이 즐겨 부르는 국제 민요가 된지 오래이다. 중부 자바, 솔로에서 시작되어 수라바야를 거쳐 자바 해(海)로 흘러 들어가는 ‘벙아완 솔로’ 는 노래 가사처럼, 오랜 세월 강가의 사람들과 애환을 같이 한 강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인도네시아를 오고 가면서, ‘벙아완 솔로’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은 개인적인 희망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럴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가, 연전에 우연히 직장 동료들과 함께 솔로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직접 ‘벙아완 솔로’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찾아간 강가는 그 동안 머리 속에서 그렸던 푸른 강물이 넉넉히 흐르는 큰 강이 아니라, 흙탕물이 수로처럼 흐르는 보잘것 없는 물 흐름이었다. 그 강가 옆으로는 자동차들이 매연을 뿜으며 분주하게 오고 가고 있었다. 머리 속 상상의 멋진 강은 여지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돌아 오는 길에 상상과 현실의 괴리를 다시 한번 뒤 돌아 보면서, 그래도 푸른 강물 위로 돛단배가 오고 가는 목가적인 강 하나 정도는 머리 속에 남겨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래야, 숨막히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의 시원한 물줄기가 되어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 같기에....
보로부두르의 바람
Angin di Candi Borobudur
김영수 (PT. Semarang Garment)
정상으로 이어진 7층 테라스 계단 길 따라
붓타의 전생과 금생을 밟고, 극락 정토에 올랐다
이렇게 쉽게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히잡을 둘러 쓴 살찐 여인네는
난간을 붙잡고 힘겹게 오르고 있다
연꽃 사라진 자리,
재스민 하얗게 피어 오른 길목 장터에선
일 없이 부처상은 팔리고
아직도 머라삐는 회색 연기를 토악질하지만
사람들은 부처를 버린지 이미 오래다
설산에서 흘러와 천년 넘게
적도 햇볕에 그을린 붓타는
이제
바람 부는 곳으로 회향하여
얼굴 찾아 헤매는 목 없는 부처들을 무연히 바라 볼 뿐
오늘도
목 마른 붓타는 장터에 나와 앉아,
물 한 모금 보시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붓타 없는 정상을 향해, 부처를 밟으며
40미터 계단을 기 쓰고 오르고 있다
[수상 소감]
문득, 높은 담장 뒤에서 좁은 문이 열리면서, 산으로 향한 길을 한 번 걸어 가 보라는 누군가의 손짓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안과 피안을 가르는 이 담장을 넘어, 저 산까지 걸어 가기에는 저의 서툰 발걸음이 무겁고 한편으로는 두렵기까지 해 주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한번 큰 용기를 내어, 저에게 손을 내밀어 높은 담장의 문을 열어 주신 따스한 눈길 따라, 저 산을 의지한 채 이제, 길을 나서고자 마음 먹으려 합니다. 가다가 지쳐 흔들릴 때마다 아직은 음표(音標)도 읽을 줄 몰라 그저 혼자중얼거리는 노래일지라도 즐겁게 부르면서 걸어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목 마르고 지친 몸으로 저 산 기슭에 도착하여, 저로서는, 결코, 아니 절대로 오를 수 없는 구름 쌓인 정상을 오체투지로 엎드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길에 노래가 있어서, 진정 행복했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직 기본적인 음정도, 박자도 모르는 음치(音癡)의 노래를 들어 주신 채인숙 작가님에게, 그리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인니문화연구원, 사공경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별에서 여기서 못다 부른 노래를 부르고 계실 눈 맑았던 시인 김윤성님에게 어설픈 조카의 서툰 첫 노래를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못난 아들만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제 삶의 반려자인 집 사람, 그리고 언제 보아도 사랑스러운 저의 ‘희’ 자매와 함께 이 기쁨을 같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