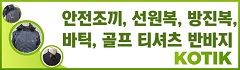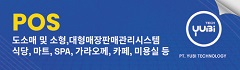한국문인협회 | 제4회 적도문학상 성인부 수필부문 이재민 / 우수상 : 동남아신문 한나프레스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7-24 12:28 조회1,032회 댓글0건본문
땅구반 쁘라후(Tanguban Perahu)보다 고사리
" 너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너는 울었고 세상은 즐거워했다.
너가 죽었을 때 세상이 울고 너는 기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라."
-인디언 격언-
땅구반 쁘라후(Tanguban Perahu)로 향하는 2차선 굽은 도로. 구김 없이 쭉쭉 자란 나무들이 도열하여 한낮에도 서늘한 그늘을 드리운다. “엄마, 저기서 사진을 찍으면 간혹 그 뒤에 귀신이 보인다고 해요.” 불혹이 넘은 아들의 허튼 소리에 칠순이 넘은 엄마가 “에구 무서워라.” 맞장구를 친다.”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눈치다. “칠십을 살다보니 귀신은 무섭지 않은데, 사람은 무섭더라...” 선문답을 한다. 사람이 무섭다는 엄마는 마주 오는 차와 부딪칠 듯 간신히 앞 차를 추월하는 현지 운전수의 난폭 운전을 더욱 무서워하는 것 같다. 바싹 얼어붙어 한 마디도 못한다. 그렇게 삼십 분쯤 한 시간쯤. 엄마의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며, 이제는 앞에 추월할 차는 또 없을까 하는 눈치다. 은근히 곡예 운전을 즐기고 있다. 하염없이 구불구불 비탈길을 올라가는 차 안에서 “언제 도착하냐, 언제 도착하냐.” 묻고 또 묻는 모습이 내 어린 딸아이와 다르지 않다. “다 왔어요.” 하는 소리에 엄마는 봄나들이 나온 소녀처럼 비로소 활짝 기지개를 켠다. 엄마의 엉덩이가, 허리가, 팔다리가 비로소 웃는다.
나는 엄마를 볼 때면, 남한강 자락에 있던 우리 집과 바람에 말린 고사리 생각이 자주 났다. 엄마는 봄이 되면 정말 많디많은 고사를 캐오곤 했다. 어릴 때 산타클로스가 선물 자루를 펼치니 그 속에서 고사리가 쏟아지는 꿈을 꿨을 정도로, 내 기억 속 자루에는 늘 고사리가 한가득했다. 학교 갔다가 돌아와 고사리 삶는 냄새가 나거나, 마당 빨래 널어놓은 아래에 가지런히 바람을 맞고 있는 고사리를 볼 때면 비로소 봄이 깊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곤 했다. 사시장철 우리 집 밥상에는 고사리 음식이 끊이지 않았지만, 엄마 빼고는 누구도 그 고사리 음식에 진저리가 나서 젓가락을 쉬이 움직이지 못했다. 혹 다닥다닥 붙은 5남매가 봄 소풍을 가기라도 하면, 엄마는 참 많은 김밥을 싸야 했다. 친구들 김밥에 들어 있던 쏘세지 대신에 우리 집 김밥에는 고사리가 들어 있었다. 우리 5남매 김밥은 늘 부끄러웠다. 봄 소풍을 다녀온 날이면 우린 아무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우리는 그 시절의 기억이 싫어 고사리를 먹지 않았다. 엄마의 힘든 삶이 솥에 몽땅 삶아진 것 같아 누구도 고사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듬해 유방암 수술을 받으신 뒤로 엄마는 웃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잊어버린 듯했다. 그래도 당신 칠순이라고 유황 냄새 풀풀 날리는 곳에 다섯 남매와 그 손주들이 모여 웃고 떠드니, 기분이 좋은지 많이 웃는다. 뱃살에 비해 팔다리가 터무니없이 가는 엄마. 빠글빠글한 파마머리, 항아리 같은 몸빼 바지, 쉼 없이 움직이던 손발. “너 아니었으면 진즉에 가난한 니 아버지 곁에서 도망을 갔어도 수십 번 갔다.“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던 엄마. 땅구반 쁘라후 분화구 앞에 섰다. “배를 뒤집어 놓은 것 같지요? 땅구반 쁘라후가 뒤집어 놓은 배라는 뜻이에요. 1926년에 화산이 터졌다고 하는데, 언제 또 이 화산이 터질지 몰라요.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구요.” “아이고, 무서워라.” 또 영혼 없는 맞장구를 친다. 길옆으로 늘어선 현지 행상들이 형형색색 팔찌, 반지를 2만루피아에 팔아도 비싸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손사래를 친다. 애초에 엄마에게 씨도 안 먹히는 흥정이다. “계란 묵고, 계란 묵고~” 삶은 달걀 파는 현지 사람의 경상도 사투리를 흉내낸 흥정은 그래도 관심이 가는지 입이 찢어져라 웃는다. 까와 도마스(Kawah Domas)로 향하는 열대 우림의 산책로. 2백년 묵은 나무 앞에서도, 꽃뱀 닮은 야생 생강을 보고도, 숲이 내 쉬는 숨소리에도 감흥이 없던 엄마의 눈빛이 순간 출렁거린다. 숲은 고생대에나 자랐을 듯한 커다란 고사리들의 서식처였다. “세상에 내 살다살다 고사리가 이렇게 지천에, 굵고 큰 건 처음 봤다.” 온천수에 족욕을 하며 온천수에 끓여온 계란을 먹겠다는 작은 내 소망은 그렇게 끝이 났다. 하늘이 꺼멓게 울상을 지을 즈음 “됐다. 가자.”하며 까만 비닐 봉투에 고사리를 가득 담고, 함박웃음을 짓는다.
자카르타로 돌아온 엄마 손에 딸아이가 아끼던 헬로키티 밴드가 칭칭 감겼다. 고사리 캐느라 손에 물집이 잡혔나 보다. 며칠을 삶고 말린 고사리가 밥상 위에 올라왔다. “ 이게 고사리냐. 엉겅퀴지. 크기만 컸지, 질겨서 이걸 어째 먹누.” 울상인 된 엄마. 맛도 없는데 너무 많다. 올 해가 지나도록 먹을 수나 있을는지......
<수상소감>
내 바닥이 보일 때처럼 부끄러울 때가 없다. 나는 어릴 때부터 외모도 비실비실했고, 머리도 물렁물렁하여 운동도 공부도 뭐 하나 제대로 내세울 게 없었다. 나는 중, 고등학교 시절 백일장에 나가 몇 번인가 상을 타고,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보내어 방송을 타게 된 것을, 스스로 글재주가 뛰어나다고 잠시 착각을 했었다. 그리하여 글을 더 잘 쓰고 싶은 마음으로 덜컥 취업도 안 되는 국어국문학과에 지원을 하였다. 헌데 막상 대학, 대학원 때 쓴 글은 중 고등 학교 때 쓴 글의 반도 되지 못했다. 글재주가 뛰어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글을 쓰는 것이 힘들었고, 또 기껏 써 내려간 글을 보여주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내 글재주의 바닥을 들여다보며, 구석에 몰린 쥐 마냥 안절부절 못했다. 이후로 내 늘어난 재주는, 사람을 믿지 않으며 손해 보지 않고, 잽싸게 돈 냄새를 맡는 것이었다. 얼마 전 나이 오십을 먹고 빈약한 글 한편을 써서 적도문학상에 응모하게 되었다. 내용도 깊이도 없고, 필력도 나처럼 비실비실한 글. 운이 좋았는지 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헌데 우수상의 어감처럼 내 꼴이 아주 우습다. 내 바닥이 다 보이는 느낌. 그냥 몸 둘 바를 모르겠다. 감사해서 너무 부끄럽다.